[우수상] 섬을 만나고 싶다 / 최철훈
별을 기다리는 등대, 섬이 그리워 밤마다 베갯머리를 흥건히 적셨다. 그때는 별을 찾아 헤매는 것이 섬으로 가는 것인 줄 알았다. 잠 속으로 돌아가 섬을 만나는 꿈을 꾸고 싶었다. 섬을 만났다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수평선 너머 바다가 물안개를 피어 올릴 때면 섬은 바다를 지우고 안개 사이로 숨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왜 안개 속엔 섬이 살지 않을까?
물 속 깊이 몸을 던져 바다를 안아 보면 언제나 자궁 속 같은 바다는 따뜻했다. 어부들의 거친 숨결이 녹아 끓는 바다 그 바다는, 하지만 내 스스로 어부들의 가슴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겠다. 부끄러운 일 같지만, 다시 섬을 찾아 별의 그림자를 기다리는 등대가 되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 별빛처럼
일출
혁명을 꿈꾸는 자의 영혼은 아름답다
증오를 삭이면서
어둠의 탯줄을 끊고 비상을 기다리는
빛의 아우성
바다가 눈높이로 달려가
덜미를 채지 않았다면, 새벽은
수평선을 표류하는 한 척
섬이 되었을 게다
암팡진 몸짓으로 어둠을 버티고 앉아
어쩌면 또 다른 음모를 부화하고
있었을 게다
어씨의 바다
어업협정 막바지쯤 배를 내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횟집을 차린 어씨
쌍 끌이 그물을 끌던 가슴으로
푸른 바다의 배를 딴다
유선형 등짝을 지나, 미끄러져
아랫도리에 이른다
심호흡 한 번에
물살을 가르며 뛰어 오르던 꼬리지느러미를 자르면
등 푸른 파도를 타던 뱃노래가
울대 깊이 잦아들고
물보라 치는 칼날로 그리움을 난도질을 하면
등대를 넘어 온 바람
그 바람이 소금기를 부리고
팽팽한 그물을 당겨 힘겨루기를 한다
뱃노래가 그리운 바다
어씨의 눈빛을 닮아 간다
삶의 그림자에 쫓겨
비린내의 등에 얹혀 아직 내리지 못한
어씨의 눈빛
뱃길 밝혀드는 핏빛
동백으로 자랄까?
어둠살 내리는 바다, 어씨의 바다를 위해
가덕도 대항
천성만 물길 따라 눈길 머무는 그 곳
목어는 비늘을 털고
영주 암 풍경소리 귓전에 흘리면서
비탈진 산길을 돌아
어진이들 눈빛 같은 대항을 찾아온다.
마을 어귀
주름진 세월에 갇힌
촌노들의 굽은 등만큼이나 더 억센 바람이
폐부 깊숙이 쿨럭 거리고
대처에서 밀려나온 고단함이
뭍 냄새 묻어 온
툇마루에 어둠을 풀어헤치면
간간이 불빛 사이로 새어 나오는 웃음
그 웃음 사이로
창을 비집고
푸른 등을 찢는 별이 내려앉는다
텃밭 한 켠
익어가는 가을의 어깨를 기댄
대항의 그림자
남해의 파도 소리에 젖어
시린 등 따뜻이 안아 줄 일출을 기다린다
지금 을숙도는
볼을 부비든 철새들의 재잘거림
섬이 그리워
잠의 어질 머리 그 베갯머리쯤 있을
둔덕을 찾아 떠나던 날
을숙도,
이젠 결코 섬일 수 없다
어둠을 지피는 마른 노을이 갈 숲을 태우고
파도처럼 등이 패인 고단함이
깃을 접는 들판 한 언저리
강 허리 잘라 놓고 버텨 선
하구언의 오만함은 이제 낯설지 않다
갈대밭 아랫도리를 적시는
신평공단의 하혈 그도 낯설지 않다
오염된 적조의 바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갯바람
객혈을 시작하면
바다를 메운 노동의 깃발이
울컥 소금기를 토해 낸다
수혈을 기다리는 빈사의 바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이 시대의 링거는
새들의 재잘거림이 사는
섬을 기다린다
다대포
낙동강 치마꼬리를 물고
산모롱이 돌아 물길 닿는 곳
다대 포는 갯벌을 품고 심드렁히 누웠다
갯마을 비린내보다 더 지독한
가난의 머리 위로
회색빛 도시가 몰려들어
하늘을 떠받치고
인스턴트 입맛에 길들여진
이야기들이 저자거리를 웅성이면
간간이, 수초에 발목 잡힌 녹슨 바다에 누워
숨을 고르는 통선의 목젖 어림쯤
불거진 울대 사이로
떼지어 날아오르는 해조음을 향한 목마름
까칠한 어부들의 삶이
자맥질을 하고 있다
터전을 잃은 찢어진 그물 사이로
쥐섬 갯바위 근처
덫을 놓고 기다리는 조류의 거센 몸부림 그도
파도에 밀려
침몰하는 다대포의 눈물 한 점
건질 수가 없었다
바다로 가는 길
창을 열고 바다로 가는 길을 찾으려다, 길을 찾으려면 먼저 파도의 속삭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속삭임보다 먼저 벽이 가로막았다. 벽 속 갈라진 틈 사이로 고물고물 기어 나오는 겨울의 상처, 그리고 무수한 죽음을 발견하고 꽃이 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 잎이, 꽃이 핀다는 것은 무수한 어둠의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을 밀어내는 것이었구나. 우린 그 눈물이 피워내는 맑은 結晶을 꽃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結晶의 향기에 취해 바다로 들어가는 길을 잃고 말았는가 보다.
바다를 방황하는 어부들의 한숨, 뻗혀 나온 세월의 덫에 걸려 허방을 놓는다. 바다로 가는 길은 어디쯤, 바다로 가는 길을 아는
누구 없소.
자갈치 이야기
어느 여름밤 포장집 석쇠에 얹혀
뼈를 발린 대포 한 잔, 밤새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파도에 씻겨 출렁이고
말갛게 비어버린
불면증 진단서가 배달되던 날
항구는 다시 도진 어지럼증에 흔들리는
뱃전에 기대여
토악질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바다는
귀 울음에 촉수를 세워
파고의 높이를 가늠했다
일출을 기다리는 자갈치의 새벽
경매꾼들의 만성 자폐로 시작된 몸짓 따라
밤새 길어 올린 싱싱한 햇덩이
경매가 시작된다.
좌판을 버텨 앉은 경상도 사투리가
장바닥을 메울 쯤
자갈치는
비릿한 술렁임으로 아침을 여는
하루를 시작한다
뭍으로 간 목어
부산항 부근
부두를 에워싸고 있는
이 도시의 불빛들이
수상하다
번뜩이는 눈빛
서로를 감춘 어둠의 모습으로
잠적한다
어둠의 벽 사이
흐느적거리는 삶의 모습이
싸늘히 식어 가는
노숙의 밤을 지킨다
꿈을 잃은 바다가 싫어
뭍으로 떠난 목어
부릴 수 없는 무게만큼 힘겨운 기다림이
덜미를 채는 시간 저 편
비늘을 털면
푸른 눈빛에 잠긴 파도
소금기를 말리고
늦은 귀가를 기다리는 조바심 사이로
설익은 시장기를 보채는
가려움이 돋는다.
몸살을 앓는 바다
해가 사는 곳
해가 사는 곳을 아시나요
절영도 봉래산 자락 휘돌아 눈길 잡히는 곳
태종대,
파도는 밤새 아랫도리를 적시며
발치 아래
설설 끓는 주전자 섬 띄워 놓고
바다로 떠난 어부의 뱃노래 그
설렘 만큼이나 억센 희망을 건져 올리면
촘촘히 들어와 박힌 금빛 물보라
비늘을 털고
가슴마다엔 물이랑이
안개 주의보가 내린
깎아지른 벼랑을 끼고 소금기 머금은 바람 그 바람이 머무는
서낭당 서낭할미의 흘러내린 치마폭 아래
저마다의 기도를 묻고 가는 사람들
가슴 높이로
동백꽃 그 마음보다 더 붉은
해가 자란다
바다가 그리운 사람들
바다와 바다가 마주칠 일은 없다. 그래서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엔 언제나 수평선이 아름답다. 나누어도 다시 어울리는 바다, 태풍 같은 벼락이 내리칠 줄 알면서, 꼭 그렇게 바람을 불러야 쓰겠는가.
책상 위 금을 긋고 니땅 내 땅 가르던 시절, 우린 벌써 오늘을 예견했을까. 가시를 품은 고난의 역사 앞에 결코 아름다움일 수 없는 반목의 세월, 그 세월이 끝끝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가슴마다에 길을 연다. 바다는 뱃길을 열어 파도의 속삭임이 배인 어부의 야윈 어깨에 한 송이 희망의 금빛 물보라를 피어 올린다.
바다와 바다가 마주하고, 바다가 그리워 바다에 사는 어부들의 가슴에 부둥켜안길 기다림이 없대서야 쓰겠는가. 뱃고동이 파도를 타는 바다가 없대서야 쓰겠는가.
망부석
동해를 바라고 서서 돌쩌귀 귀를 세운 망부석의 기다림조차
천년의 세월에 깎여
낮아져만 가던 숨소리
그래서 바다는 쪽빛 하늘에 기대어 울고 있나 보다.
바닷길 열어 제치고 수평선 너머 손짓하는 그대
넋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다면
피울음 삼키던 앞섶 이젠 벗어도 좋으련만
서라벌 하늘을 울던 종소리
아직 건너지 못한 그 멍에의 어질 머리 앞에
살을 허물어 저자거리를 적신
碧花의 눈물 나의 가슴을 돌아
다시 천년의 기다림을 잠 못 들게 하는구나.

 본논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문학은 사회적 정치적 현실 추수 심리에 의해 촉발된 세계 인식을 크게 바탕삼음으로써 그 지배구조에 예속될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를 새롭게 형성하고 이끌어나가는 비판적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격변하는 시대조류의 변천 속에서도 자기 영역을 개척해 가는 문학적 실천을 요청받게 된다. 그 실천은 체험의 심화, 감정의 절제, 함축적 언어 행위 등으로 구성되는 인문주의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나아가 물신주의에 대한 준열한 비판과 극복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본논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문학은 사회적 정치적 현실 추수 심리에 의해 촉발된 세계 인식을 크게 바탕삼음으로써 그 지배구조에 예속될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를 새롭게 형성하고 이끌어나가는 비판적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격변하는 시대조류의 변천 속에서도 자기 영역을 개척해 가는 문학적 실천을 요청받게 된다. 그 실천은 체험의 심화, 감정의 절제, 함축적 언어 행위 등으로 구성되는 인문주의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나아가 물신주의에 대한 준열한 비판과 극복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주의를 지향하게 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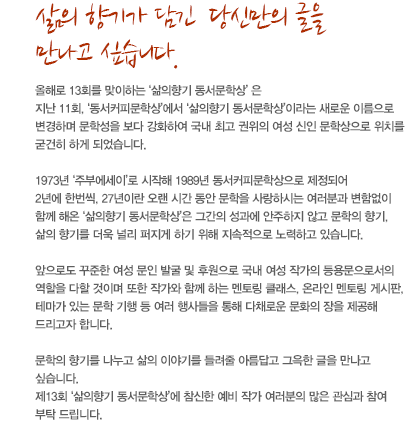
 Sin Dong-yup Prize for Literature
Sin Dong-yup Prize for Literature  1930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
1930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 본명은 기행. 1912년 평북 정주 출생으로 1929년 오산고보를 졸업하고 토오꾜오 아오야마(東京靑山) 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 1934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로 있었으며,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그 母와 아들」이, 1935년에 시 「定州城」이 각각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옴. 1936년 시집 『사슴』을 간행하고, 그해 함흥 영생고보 교원으로 전직, 1938년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가 1939년 만주로 이주. 1948년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을 『學風』창간호에 발표하면서 남쪽에 알려진 작품활동을 끝을 맺게 되며, 1987년 창비에서 『白石詩全集』(이동순 편)이 간행되면서 분단의 엄혹한 현실 속에 가려져왔던 그의 문학이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
본명은 기행. 1912년 평북 정주 출생으로 1929년 오산고보를 졸업하고 토오꾜오 아오야마(東京靑山) 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 1934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로 있었으며,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그 母와 아들」이, 1935년에 시 「定州城」이 각각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옴. 1936년 시집 『사슴』을 간행하고, 그해 함흥 영생고보 교원으로 전직, 1938년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가 1939년 만주로 이주. 1948년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을 『學風』창간호에 발표하면서 남쪽에 알려진 작품활동을 끝을 맺게 되며, 1987년 창비에서 『白石詩全集』(이동순 편)이 간행되면서 분단의 엄혹한 현실 속에 가려져왔던 그의 문학이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