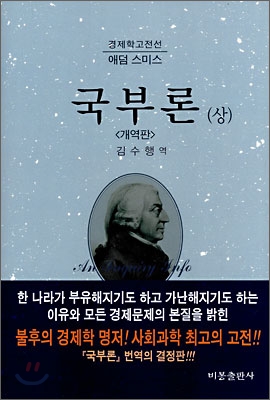이번 시간에는 ‘주역(周易)‘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합니다. 앞으로 연재상으로는 여러 회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전강독 강의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몇 번의 강의로는 주역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무엇부터 강의해야 하나 매우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주역을 60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64괘의 괘사만 읽으려 하더라도 1년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회의 강의로 주역을 읽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의는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역시 ‘주역의 관계론’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주역은 동양적 사고의 가장 심층에 놓여 있는 기본적 사고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 담겨 있는 사상이란 말하자면 수 천년 수 만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경험의 누적입니다. 그 반복적 경험의 누적 속에서 발견한 법칙성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을 역경(易經)이라 하여 유가경전(儒家經傳)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왕필(王弼)도 주역과 노자를 회통(會通)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주역은 동양사상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역은 쉽게 이야기해서 점치는 책입니다. 점쳤던 결과를 기록해 둔 책이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점을 쳐 본 사람은 많겠지만 주역 점을 쳐 본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역을 읽어 본 사람은 없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주역은 점치는 책입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나는 점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을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류의 의기(意氣) 방자(放恣)한 사람에 비하면 훨씬 좋은 사람이지요.
겸손한 사람이며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은 강한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약한 사람으로 느끼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대체로 선량한 사람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선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선량하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선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량하나 무력한 사람’이 대개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집니다만 세상에는 반면(半面)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半面)이란 모순의 반대측면을 이루는 것으로 반면(半面)이면서 동시에 반면(反面)이기도 합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일면입니다. 본질을 구성하는 일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약함이 선량함의 반면일 수 있습니다. 본론에서 빗나간 이야기였습니다만 주역이 점치는 책이고 점치는 마음을 우리는 비과학적이라고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는 정직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있는가? 손 한 번 들어보겠습니까? 그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귀신이 있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귀신을 만나거나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문득 문득 귀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을 나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참이었기 때문에 복도에 불을 끄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구실이 6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타고 문이 닫히자 여자 목소리로 멘트가 나왔어요. “올라갑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내려가야 하는데 어떤 여자귀신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려는가 보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었지요.
아마 캄캄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던 거지요.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었던 거지요. 당연히 내려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여자귀신이 나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려는가 보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지요.
귀신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식의 밑바탕에는 귀신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인간에게 두려운 것, 즉 경외의 대상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신이나 귀신이 아니더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오만을 질타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을 치는 마음이 그런 겸손함으로 통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상(相) 명(命) 점(占)으로 나눕니다.
상(相)은 관상(觀相) 수상(手相)과 같이 운명지어진 자신의 일생을 미리 보려는 것이며, 명(命)은 사주팔자(四柱八字)와 같이 자기가 타고난 천명, 운명을 읽으려는 것입니다.
상(相)과 명(命)이 이처럼 이미 결정된 운명을 미리 엿보려는 것임에 반하여 점(占)은 ‘선택(選擇)’과 ‘판단(判斷)’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 결정이 어려울 때에 찾는 것이 점(占)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인간의 지혜와 도리를 다 한 연후에 최후로 찾는 것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경(書經) 홍범조(洪範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汝則有大疑 謀及乃心 謀及卿士 謀及庶人 謀及卜筮
汝則從 龜從筮從 卿士從 庶民從 是之謂大同
의난(疑難.의심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 임금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 다음 조정대신(朝廷大臣)에게 묻고 그 다음 서민(庶民)에게 묻는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의난이 풀리지 않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복서(卜筮)에 묻는다 즉 점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 자신을 비롯하여 조정대신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한 다음에 최후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괘와 서민의 의견과 조정대신 그리고 임금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를 대동(大同)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제로 진행하는 대동제(大同祭)가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것이지요. 하나되자는 것이 대동제의 목적이지요.
주역은 판단의 준거(準據)입니다. 무수한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구성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기초로 미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역은 귀납지(歸納知)이면서 동시에 연역지(演繹知)입니다. 주역이 점치는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의 누적으로부터 법칙을 이끌어내고 이 법칙으로부터 다시 구체적 사안을 판단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관계론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1. 주역의 의미
우선 주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주역의 본 이름은 그냥 역(易)입니다. 그리고 역(易)에는 하(夏)나라의 연산역(連山易. 神農氏시대의 역), 은(殷)나라의 귀장역(歸藏易. 黃帝시대의 역)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傳)하는 것은 주나라 문왕(文王)때의 역(易)이라 추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周易)이라 합니다.
역(易)은 글자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일(日)과 월(月)의 회자(會字)입니다. 일(日)은 양(陽), 월(月)은 음(陰)을 의미하여 역은 음양(陰陽)이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음양의 대립과 통일로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天地), 일월(日月), 강유(剛柔), 고저(高低), 명암(明暗), 대소(大小), 남녀(男女), 군신(君臣), 선악(善惡), 길흉(吉凶) 등 천지 만물과 그것의 변화를 음양과 음양의 작용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모순(矛盾), 대립(對立), 통일(統一), 연관(聯關), 전화(轉化) 등 변증법적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주역정의’(孔潁達 周易正義)에 ‘易一名而含三義 易簡 易變 不易’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이라는 이름에는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 3가지가 바로 역은 간단하고(易簡), 역은 변화이며(易變), 역은 불변이다(不易)라는 것입니다. 그 3가지의 함의(含意)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역(易)은 간이(簡易)의 의미입니다. 즉 간단하고 쉽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현상을 간소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구성과 운동을 2개의 개념 즉 음양으로 설명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이루어내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세상의 변화를 8괘와 64괘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단순화된 추상적인 모델입니다.
2) 역(易)은 변역(變易) 즉 변화라는 뜻입니다. 즉 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은 변화에 관한 법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역은 사물의 변화 발전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춘하추동(春夏秋冬)의 변화에서부터 생주이멸(生住移滅) 길흉화복(吉凶禍福)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무한한 변화의 와중에서 영위됩니다.
이 변화의 와중에서 피고취락(避苦趣樂)하려는 의지는 생명의 운동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읽으려는 의지는 매우 현실적이며 지극히 근원적인 생명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역(易)은 불역(不易) 즉 불변의 의미입니다. 주역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변화의 내면을 일관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불변의 진리라는 뜻이지요.
복잡다단한 변화발전의 과정을 법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주역은 제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역(不易)이란 의미는 두 번째의 의미인 변역(變易)과 첫 번째의 의미인 간역(簡易)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변화를 간단한 개념으로 법칙화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주역이 이와 같은 3가지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역이 사물의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이를 법칙화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대별(大別)합니다. 공자 이전 2천5백년과 공자 이후 2천5백년이지요.

공자 이전 2천5백년은 점복(占卜)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 이후의 시기는 주역의 견(經.텍스트)에 대한 해석(傳)의 시대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물과 사물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 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傳)은 이를테면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란 책은 ‘춘추(春秋)’라는 텍스트(經)를 좌씨(左氏.左丘明)가 해설한(傳) 책이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역의 경(經)과 전(傳)에서 동양적 사고의 체(體)와 용(用)을 함께 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학파가 경에 딸린 10개의 해설인 십익(十翼)을 이루어 놓기 이전은 복서미신(卜筮迷信)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역의 경(經) 즉 텍스트 자체는 동양사상의 근본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오랜 경험과 그 경험의 반복과 축적 위에서 형성된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합니다.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점(占)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내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자의성(恣意性)을 지적하여 미신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괘(卦)의 구성과, 점을 친 기록들인 괘사(卦辭) 효사(爻辭)에는 동양사상의 원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을 흔히 춘추전국시대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5백50년 간은 기존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유일한 국가 경영목표를 위하여 사활을 건 무제한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행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수립되기 이전의 혼란한 질서 속에서 불변의 진리와 법칙성에 대한 탐구가 불역(不易)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시기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이론에 대한 근본적 담론이 가장 왕성하게 개진되었던 시기였음은 전에 이야기했지요.
한마디로 주역은 변화에 대한 법칙적 인식이 절실하게 요청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시대적 산물이라고 합니다.
2. 주역의 구성
위에 보이는 그림이 주역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태극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兩儀)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팔괘 중에서 태극기에 있는 4개만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처음 보지요? 음양을 나타내는 부호를 효(爻)라고 합니다만 이는 물질성을 구성하는 요소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효사(爻辭. 점을 친 문자기록)에서는 그것을 어떤 단계의 의미로 읽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의미로 읽기도 하고 어떤 지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8개의 괘(卦)를 중심으로 주역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괘(卦)는 걸다는 뜻입니다. 걸어 놓고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괘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아 놓는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괘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8개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 모양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괘의 작용과 성질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위 표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의미만을 표시하였습니다.
3.효와 괘의 의미
도대체 이 효와 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난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물(事物)이 있고 사물과 사물이 관계하여 이루어내는 사건(事件)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사건이 중첩되거나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事態)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또는 전쟁상태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효와 괘는 이를테면 사물과 사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역의 각 구성부분을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효(爻)가 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상(四象)이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괘(卦)가 그런 의미를 띠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역의 각 구성부분은 어느 경우든 사물, 사건, 사태와 같은 범주적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주적 인식이 곧 철학적 인식입니다. 주역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물질세계의 연관성으로부터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역(簡易)이기 때문에 물질세계의 복잡한 연관을 모두 담아낼 수는 물론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각 구성부분을 여러 범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범주가 매우 중층적입니다. 결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제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역의 판단형식이 매우 중층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형식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서구적 사고양식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시실입니다. 주관적인 판단형식으로서의 범주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객관적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판단형식에 있어서의 단순함이 근대성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각자의 사회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사회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인식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관과 인간관 등 여러분이 익숙하게 구사하고 있는 인식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다’ 또는 ‘인간은 이기적이다’와 같은 인식 틀을 봅시다. 이러한 사고는 매우 단순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개인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집합인 사회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인식으로부터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한 자본주의의 시장원리가 지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이러한 인식 틀은 사회를 단일한 요소로 환원하여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양적 확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역의 구성과 비교하자면 효(爻)로써 8괘인 소성괘를 설명하고 나아가 64괘인 대성괘마저도 효의 단순한 집합으로 설명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극히 일차원적 사고방식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를테면 계급적 관점으로 사회구성을 설명하는 소위 좌파적 인식 틀은 어떻습니까? 신분(身分)이나 혈연(血緣)이나 다른 집단을 단위로 하여 사회구성을 이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과는 다른 범주로 사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에 대한 것만 아니라 세계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구조를 반성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기계적이고 단선적인 논리로써 변화를 읽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구공과 당구공이 부딪치는 경우처럼 원인과 결과라는 단선(單線) 논리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효와 괘를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예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주관적 판단형식으로서의 범주적 인식의 단순함을 반성하자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앞으로 검토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인식 틀에 비하여 주역은 객관적 세계의 연관성을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4.주역의 경(經)과 전(傳)
1) 주역의 經
8괘(八卦), 64괘(六十四卦), 괘사(卦辭), 효사(爻辭)를 주역의 경(經)이라 합니다. 이것은 8개의 소성괘(小成卦), 64개의 대성괘(大成卦) 그리고 64개의 괘사, 3백84개의 효사를 의미합니다.
괘와 효는 고대문자이며, 괘사(卦辭), 효사(爻辭)는 점을 친 문자기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의 주역의 구성이란 그림에서 보는 8괘를 소성괘(小成卦)라고 합니다만 이 소성괘를 2개 겹쳐서 만들어진 괘를 대성괘(大成卦)라고 합니다. 이 대성괘가 모두 64개가 있지요. 8 x 8 = 64지요.
이 64개의 대성괘는 각각 한 개씩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변화의 패턴을 6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 64개의 대성괘마다 괘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64개의 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성괘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효마다 효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사의 숫자가 64 X 6 = 3백84개나 됩니다.
주역의 기본적 범주는 바로 이 64개의 대성괘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대성괘에는 그 괘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름이 명명되어 있고 괘 전체의 의미를 부연하는 괘사가 달려 있으며 괘를 구성하는 6개의 부분과 그 6개 부분이 서로 맺고 있는 시공간적 관련성을 효사가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대성괘를 주역의 기본적 범주로 이해하는 경우 우리는 칸트나 헤겔 또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들과는 그 수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범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형식의 단순함에 비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64개의 대성괘는 지금까지 보여온 어떠한 철학체계보다도 객관세계의 복잡한 연관성을 최대한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주역의 傳
전(傳)이란 괘사와 효사에 관한 후대(秦漢초)에 성립된 10개의 해설을 말합니다. 경에 달린 10개 날개란 뜻으로 십익(十翼)이라 합니다. 공자의 저작이라고 전하나 공동창작으로 추측됩니다.
십익(十翼)은 단전(彖傳) 上下, 상전(象傳) 上下, 계사전(繫辭傳) 上下, 문언전(文言傳),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제 해설에서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단전(彖傳)은 괘사를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彖)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상전(象傳)에는 대상(大象)과 소상(小象)이 있는데 대상은 괘 전체의 뜻과 상하(上下)괘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고 소상은 각 효의 효사를 설명한 것입니다.
계사전(繫辭傳)은 괘사를 철학적으로 논리부여하고 괘사와 효사를 묶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문언전(文言傳)은 건위천(乾爲天)과 곤위지(坤爲地)괘에만 있으며 괘사, 효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괘전(說卦傳)은 괘에 대한 해설입니다.
서괘전(序卦傳)은 64괘의 배열순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乾爲天.-->
2.坤爲地.-->
3.水雷屯(준은 盈 즉 채운)-->
4.山水蒙(어릴 몽)-->
5.水天需(음식, 먹임)-->
6.天水訟(송사,재판)-->
7.地水師(무리)-->
8.水地比(친화)-->
9.風天小畜(축적) ----->
잡괘전(雜卦傳)은 64괘를 2괘씩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처음 읽는 경우는 십익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경문은 그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해설서를 먼저 읽어보면 주역의 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5. 효(爻)와 괘(卦)
1) 양효(陽爻.![]() )는 하늘(天) 또는 남자(男)를 나타내고 음효(陰爻.
)는 하늘(天) 또는 남자(男)를 나타내고 음효(陰爻.![]() )는 땅(地) 또는 여자(女)를 나타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는 땅(地) 또는 여자(女)를 나타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3개의 효(爻)로 1개의 괘(卦)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괘를 소성괘(小成卦)라 합니다. 8괘가 그것입니다. 3개의 효로 괘를 만드는 것은 3개의 효가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양학이 자연을 생기(生氣)의 장(場)으로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개념을 천지인의 삼재(三才)로 구성하는 것 역시 그러한 사상의 일환입니다.
효(爻)의 명칭은 아래에서부터 초(初)효, 이(二)효, 삼(三)효, 사(四)효, 오(五)효, 상(上)효로 읽습니다.
양효를 구(九), 음효를 육(六)으로 씁니다. 그래서 초효가 양효인 경우에는 그것을 초양(初陽)이라 읽지 않고 초구(初九)라 읽습니다.
그리고 이효(二爻)가 음효인 경우에는 이음(二陰)이라 읽지 않고 이륙(二六)이라 읽습니다. 양(陽)을 구(九)라 하고 음(陰)을 육(六)이라고 하는 까닭에 대하여 많은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九)가 홀수이고 육(六)이 짝수여서 각각 양과 음을 표시하는 숫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정도 이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미 사용했듯이 제1효를 초효(初爻)라 하고 제6효를 상효(上爻)라 합니다. 그래서 초육(初六), 상구(上九)등으로 씁니다.
2)팔괘는 위 표에서 설명하였듯이 태극(太極) --> 음양(陰陽)--> 사상(四象)--> 팔괘(八卦)로 분화된 것입니다.
![]() 건(乾-天)
건(乾-天)
![]() 태(兌-澤)
태(兌-澤)
![]() 이(
이(![]() )
)
![]() 진(震-雷)
진(震-雷)
![]() 손(巽-風)
손(巽-風)
![]() 감(坎-水)
감(坎-水)
![]() 간(艮-山)
간(艮-山)
![]() 곤(坤-地)
곤(坤-地)
이 8개의 괘는 그 모양과 의미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름과 기능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역을 읽을 때 기본적인 단위, 즉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분들은 이 팔괘를 손가락으로 자유자재로 표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이렇게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3개의 손가락으로 칩니다. 이 엄지를 나머지 검지, 중지, 무명지 이 3개의 손가락과 연결하거나 뗌으로써 8괘를 표현합니다.
건괘(![]() )는 엄지와 나머지 3손가락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읽기는 건삼련(乾三連)으로 읽습니다. 3효가 모두 연결된 모양 즉 양효(陽爻)라는 뜻입니다.
)는 엄지와 나머지 3손가락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읽기는 건삼련(乾三連)으로 읽습니다. 3효가 모두 연결된 모양 즉 양효(陽爻)라는 뜻입니다.
태괘(![]() )는 엄지와 중지 무명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검지는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태상절(兌上絶)이라 읽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효(爻)만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즉 음효(陰爻)라는 뜻입니다.
)는 엄지와 중지 무명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검지는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태상절(兌上絶)이라 읽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효(爻)만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즉 음효(陰爻)라는 뜻입니다.
감괘(![]() )는 중지와 엄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검지와 무명지는 엄지와 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감중련(坎中連)이라 읽습니다. 감괘는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 즉 가운데 효가 양효(陽爻)라는 뜻이지요. 이 감중련은 조지훈의 시(詩)에 부처님의 손가락을 표현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대학의 교양국어 강의시간에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지요.
)는 중지와 엄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검지와 무명지는 엄지와 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감중련(坎中連)이라 읽습니다. 감괘는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 즉 가운데 효가 양효(陽爻)라는 뜻이지요. 이 감중련은 조지훈의 시(詩)에 부처님의 손가락을 표현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대학의 교양국어 강의시간에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지요.
이괘(![]() )는 엄지와 검지, 무명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중지만 엄지와 떨어진 모양입니다. 읽기는 이허중(
)는 엄지와 검지, 무명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중지만 엄지와 떨어진 모양입니다. 읽기는 이허중(![]() ), 이괘는 가운데가 비었다, 즉 가운데가 음효(陰爻)라는 뜻입니다.
), 이괘는 가운데가 비었다, 즉 가운데가 음효(陰爻)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괘들을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진하련(![]() ), 손하절(
), 손하절(![]() ), 간상련(
), 간상련(![]() ), 곤삼절(
), 곤삼절(![]() ) 등으로 읽습니다. 각자 손가락으로 표시해봅시다.
) 등으로 읽습니다. 각자 손가락으로 표시해봅시다.
이 팔괘 하나 하나는 음양의 구분이 있습니다. 팔괘는 음괘가 있고 양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음양을 결정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8괘를 구성하는 3개의 효 중에서 양효(陽爻)가 홀수이면 양괘(陽卦), 음효(陰爻)가 홀수이면 음괘(陰卦)가 됩니다. 셋 중에서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陽)이 하나면 당연히 음(陰)이 둘이고 음(陰)이 하나면 양(陽)이 둘임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소수가 전체 성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까? 남자 두 사람과 여자 한사람인 집합(集合)에서 결국 여자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면 2가 되어 다수가 되고 그 다수인 2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지요. 남자 2대 여자 1의 구성이니까 결합의 주도권은 당연히 여자가 행사하지요.
반대로 여자 두 사람과 남자 한 사람인 집합에서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전체 성격을 결정합니다. 괘의 음양을 결정하는 방법이 매우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 8괘 두 개를 상하(上下)로 겹쳐 놓은 것을 대성괘(大成卦)라 합니다. 이에 비하여 8괘는 소성괘(小成卦)라 합니다.
대성괘는 상하 2개의 8괘로 이루어져 있지요. 위의 괘를 상(上)괘 또는 외(外)괘라 하고 아랫 괘를 하(下)괘 또는 내(內)괘라 합니다. 대성괘는 모두 64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8 X 8 = 64지요.
대성괘는 두 소성괘의 성질, 위치에 따라 그 성격과 명칭이 정해지기도 하고 두 소성괘가 이루어내는 모양에서 명칭과 뜻을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이(![]() )’괘는 간(艮,
)’괘는 간(艮,![]() )과 진(震,
)과 진(震,![]() )을 상하로 겹쳐 놓은 것이지요. '
)을 상하로 겹쳐 놓은 것이지요. '![]() ’괘의 모양은
’괘의 모양은 ![]()
![]() 입니다.
입니다.
그 모양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상하의 입술과 그 가운데 치아(齒牙)가 있는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턱과 같아서 괘의 이름을 턱 이(![]()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를 양(養)으로 하였습니다.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를 양(養)으로 하였습니다.
괘의 이름을 짓는 방법이나 뜻풀이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팔괘의 모양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간(艮)은 산(山)이고 진(震)은 뇌(雷)입니다. 산 아래에 우뢰가 있는 형상입니다. 땅 속에 잠재력을 묻어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를 양(養)이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지요.
‘진(晉)’괘는 곤(坤,![]() )괘 위에 이(
)괘 위에 이(![]() ,
,![]() )괘를 올려놓은 형상입니다. ‘晉’괘의 모양은
)괘를 올려놓은 형상입니다. ‘晉’괘의 모양은 ![]()
![]() 입니다.
입니다.
곤(坤)은 땅(地)을 의미하고 이(![]() )는 불(火)을 뜻합니다. 땅위에 불이 있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이 진(晉)괘는 지평선에 해가 뜨는 형상으로 풀이하여 진(晉)으로 하고 그 뜻을 나아갈 진(進)으로 하였습니다.
)는 불(火)을 뜻합니다. 땅위에 불이 있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이 진(晉)괘는 지평선에 해가 뜨는 형상으로 풀이하여 진(晉)으로 하고 그 뜻을 나아갈 진(進)으로 하였습니다.
4) 64개의 대성괘를 상경(上經) 30괘(卦)와 하경(下經) 34괘(卦)로 나눕니다. 주역을 이처럼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편의상 상하(上下)로 나눈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덕경(道德經)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30은 3이 홀수로 양이고, 34는 짝수로 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직 주역의 경문(經文)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주역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의 특이한 점을 몇가지 밝혀 두어야 합니다. 이른바 주역 고유의 독법(讀法)입니다.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역 고유의 독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독법으로부터 주역사상의 특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점(占)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주역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역을 읽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개념이 매우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위(位)와 응(應)에 대하여 주로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위(位)
주역의 독법에 관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위(位)입니다. 즉 ‘자리’입니다. 어떤 효(爻)의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상입니다.
대성괘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각각의 효가 위치하고 있는 1(初), 2, 3, 4, 5, 6(上)의 여섯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자리는 1, 3, 5는 양(陽爻)의 자리이고 2, 4, 6은 음효(陰爻)의 자리입니다.
양효가 양효의 자리 즉 1, 3, 5에 있는 경우를 득위(得位)라 합니다. 음효가 음효의 자리인 2, 4, 6에 있는 경우도 물론 득위라 합니다.
효가 그 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실위(失位)라 합니다. 양효가 음효의 자리 즉 2, 4, 6에 있는 경우는 실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음효가 양효의 자리인 1, 3, 5에 있는 경우도 실위인 것은 물론입니다.
각 효는 득위하여야 좋은 것입니다. 주역 사상에 있어서 이 ‘위(位)’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양효라 하여 어떤 자리에 있거나 항상 양(陽)의 성질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음효는 어떤 자리에 있거나 음효일 뿐이라고 하는 고정된 관점은 없습니다.
개별적 존재에 대해서는 그것의 고유한 본질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한 개별적 본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는 동양적 전통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 처지(處地)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고 그 운명도 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금언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말은 처지에 따라 그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처지에 눈이 달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요. 눈이 이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발(立場)에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입장(立場)이라 합니다. 계급도 말하자면 처지(處地)입니다. 당파성(黨派性)과 계급적 이해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개인에게 있어서 그 자리(位)가 갖는 의미는 운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처하는 경우 십중팔구 불행하게 됩니다. 제 한 몸만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에 빠트리고 나아가서는 일을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지요? 어떤 자리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리인가를 아는 비결이 어떤 것이지 궁금하지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나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터보다 집이 크면 그 터의 기(氣)가 눌립니다.
용적율(容積率)의 개념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기(地氣)가 눌리지 않으려면 용적율이 50% 미만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딩은 지기를 받지 못하는 건축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땅에 너무 많이 쌓아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터와 집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집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사람보다 크면 사람이 집에 눌립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조금 작은듯한 집이 좋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궁금한 ‘자리’의 문제로 돌아가지요.
그 ‘자리’가 ‘사람’보다 크면 사람이 상(傷)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 ‘70%의 철학’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100이라면 70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30정도의 여유는 놀고 먹자는 것이 아니지요. 30%정도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창조적 공간이 되고 예술적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70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의 능력을 요구받는 자리에 앉을 경우 그 부족한 30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30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거짓이나 위선으로 채우거나 아첨과 함량미달의 불량품으로 채우게 되겠지요. 결국 자기도 파괴되고 일 그 자체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잘못된 사람이 차지하고 앉아서 나라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아랑곳없이 너나 할 것 없이 ‘큰 자리’나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세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70%의 자리’가 득위(得位)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축구경기에서도 이 70%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선수 중에 슛을 130%로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경기를 보는 기회가 있으면 누구인가를 찾아보세요. 거명(擧名)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반드시 골인시키겠다는 의지가 과잉입니다. 그러한 과잉의지로 슛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골을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슛은 골키퍼가 받아내기에 상당히 불편한 곳으로 공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0%의 슛입니다.
여담이었습니다만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양학에서는 그것보다는 먼저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체의 능력은 개체 그 속에 있지 않고 개체가 발딛고 있는 처지와의 동태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논리가 바로 주역의 사상입니다.
어떤 사물의 이해나 어떤 사람의 길흉화복이 그 사물이나 사람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역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득위(得位)와 실위(失位)의 개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서구의 존재론(存在論)과는 다른 동양학의 관계론(關係論)입니다. 주역의 독법은 이처럼 매우 철저한 관계론적 패러다임입니다.
2) 중(中)과 정(正)
위(位)와 응(應)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몇가지 개념을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역의 관계론적 성격을 드러내는데 강의의 초점을 둔다면 설명이 없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中)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합시다. 대성괘(大成卦)를 구성하고 있는 여섯 개의 효 중에서 제2효와 제5효를 ‘중(中)’이라 합니다.
2효와 5효는 각각 하괘와 상괘의 가운데 효입니다. 가운데 효를 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역에서는 가운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 있거나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쟁사회의 원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강의시간에 질문하라고 해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거지요. 중간은 무난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뒤로 돌아 갓”을 할 경우에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내내 똑 같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뒤로 돌아가라는 구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요. 그래서 세파를 많이 겪은 노인들은 모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그저 중간만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중간과 가운데를 선호하는 정서는 매우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물론 중간을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그 선호하는 이유가 무난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중(中)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과 뒤에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풍부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둑 5급이 바둑친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바둑 1급은 비슷한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중간은 그물코처럼 앞뒤로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망의 적이 되고 있는 선두(先頭)는 스타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이지요. 그 자리는 모든 영광이 머리 위에 쏟아질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매우 힘든 자리입니다.
나는 물론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걸리는 곳이 선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두가 전체 국면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두는 겨우 자기 한 몸의 간수에 여력이 있을 수 없는 고단(孤單)한 처지(處地)입니다.
그와 반대로 맨 꼴찌는 마음 편한 자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마 가장 철학적인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기를 쓰고 달려가야 할 곳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내가 무기징역 받고 감옥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헌 옷 입고 햇볕에 앉아 있을 때의 심사(心事)가 무척 편했던 기억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곳이 비록 편안하고 한적한 달관(達觀)의 공간이긴 하지만 그곳은 무엇을 도모하거나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왜소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관계 맺기에 매우 창백한 처소(處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역에서는 중간을 매우 좋은 자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있는 자리로 칩니다.
막상 가장 위에 있는 제6효인 상효(上爻)는 실권(實權)에서 물러난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음효가 음의 자리에 양효가 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정(正)이라고 하면서도 가운데 효가 즉 중(中)이 득위하였는가 득위하지 못하였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음(陰)2효와 양(陽)5효는 중(中)이면서 득위(得位)하였기 때문에 이를 중정(中正)이라 합니다.
중정(中正)은 매우 높은 덕목으로 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중정(中正)’이란 현판이나 붓글씨를 많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중정(中正)이지만 양5효를 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음2효가 하괘를 주도(主導)하는 효임에 비하여 양5효는 괘 전체의 성격을 주도하는 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응(應)과 비(比)
우선 응(應)이란 무엇인가부터 보지요. 위(位)란 것이 효와 그 자리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응(應)은 효와 효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효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섯 개의 효 중에서 1효와 4효, 2효와 5효, 3효와 6효의 음양상응(陰陽相應)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괘의 1, 2, 3효와 상괘의 1, 2, 3효가 서로 음양상응관계 즉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응(應)입니다.
주역사상에서는 위(位)보다 응(應)을 더 중요한 개념으로 칩니다. 이를테면 위(位)의 개념이 개체단위의 관계론이라면 응(應)의 개념은 개체와 개체가 이루어내는 관계론입니다. 이를테면 개체간의 관계론이지요.
그런 점에서 위(位)가 개인적 차원의 관점이라면 응(應)은 사회적 차원의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위(失位)도 구(咎.허물)요 불응(不應)도 구(咎)이다. 그러나 실위(失位)이더라도 응(應)이면 무구(無咎)이다”고 합니다.
실위(失位)도 허물이고 불응(不應)도 허물이어서 좋을 것이 없지만 설령 어느 효가 득위(得位)를 못하였더라도 응(應)을 이루고 있다면 허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나쁜 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位)보다 응(應)을 더 상위(上位)의 개념으로 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도처에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집이 좋은 것보다 이웃이 좋은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 하지요. 산다는 것은 곧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보면 응(應)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의 개념도 바뀌어서 최근에는 직장동료들이 좋은 곳을 좋은 직장으로 칩니다.
위(位)가 소유(所有)의 개념이라면 응(應)은 접속(接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다가 그만 소유와 접속의 문제에 언급하게 되었습니다만 나는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소유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접속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창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실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종말’에서 전망하는 접속형태의 소비란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분할’입니다. 시간적으로 분할된 소유이며 동시에 공간적으로 분할된 소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새로운 생산방식에 조응한 ‘다품종 소량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단위를 더욱 작은 단위로 분할함으로써 소비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변화라기보다는 소비패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기산업사회의 소비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비의 변화, 소유의 변화는 물론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회 완료적인 매매는 매매성립과 동시에 매매쌍방의 관계가 종결됩니다. 남는 것은 물건과 소유자와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접속형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쌍방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位)를 소유에 비유하고 응(應)을 접속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유가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단계, 즉 임대자의 소유권마저 종말을 고하고 모든 소유가 접속으로 전환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적 소유나 협동적 소유만 존재하는 소위 사회주의적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의 종말’이 전제하고 있다면, 그런 점에서 접속은 이를테면 사회적 개념, 사회주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자의 소유가 사적 소유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비형태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후기산업사회의 변화된 소비패턴이며 보다 정교해진 마켓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소유보다는 접속에 더 익숙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소유가 아닌 접속입니다. 독선생(獨先生)을 두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감상을 하는 것도 소유가 아닌 접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접속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소유로부터 접속으로 전환하리라는 리프킨의 주장은 매우 새삼스러운 이야기로 들리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삶과 정서는 기본적으로 접속과 관계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응(應)의 개념은 우리의 삶을 저변에서 지탱하는 원천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지요. 응(應)은 소유의 개념과는 구별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소유제도 즉 사유재산제도는 사실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할 수 있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호소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自由)’가 바로 이 소유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응(應)의 개념은 자본주의사회, 개인주의사회, 그리고 경쟁사회의 보편적 덕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양문화의 패러다임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단연 이 응(應)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應) 이외에도 효와 효의 상응관계를 보는 개념으로 비(比)가 있습니다. 이 비(比)는 인접한 상하(上下) 2효의 상응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응(應)이 하괘와 상괘 간의 상응관계를 보는 것임에 비하여 이 비(比)는 인접한 두 효의 음양상응을 본다는 점에서 응(應)에 비하여 다소 그 관계의 범위가 협소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 성격은 관계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상에서 주역의 몇가지 관점(觀點)을 소개하였습니다만 그나마 너무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주석서(註釋書)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관념적인 해석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오히려 주역 이해에 더 장애가 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전강독강의에서는 벌써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관계론의 재조명이라는 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것만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효의 명칭(名稱)에 관한 것입니다. 효가 처하는 위치 즉 아래위에 있는 효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는 이름마저 달라지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성격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음효 위에 있는 양효 즉 양재음상(陽在陰上)인 경우를 거(據)라고 하고 그 의미는 공제(控制)입니다.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음효가 양효 아래에 있는 경우 승(承)이라 합니다. 즉 음재양하(陰在陽下)인 경우를 승(承)이라 하고 순종(從順)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음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양효 위에 있을 때 즉 음재양상(陰在陽上)일 때 승(乘)이라 호칭하고 그 의미를 반상(反常) 즉 역(逆)으로 읽습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주역의 독법은 철저하리만큼 관계론적입니다. 개별적 의미는 매우 협소합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그 개별적 존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맺고 있는 관계망 속에서 사후적으로 규정되고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역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관계론(關係論)’입니다. 효와 그 효가 처한 자리(位)의 관계, 효와 효의 관계 즉 응(應), 비(比). 그리고 괘와 괘의 관계 등 ‘관계’가 판단과 해석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주역사상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물과 현상, 그리고 존재와 변화에 관한 범주적(範疇的) 판단형식(判斷形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역사상에서 우리는 동양적 판단형식 즉 동양적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형식과 사고방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개별적 존재나 개별현상에 대한 존재론(存在論.實體論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적 관점보다는 존재와 존재들이 맺고 있는 관계망(關係網)에 대한 관점이 기본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학파가 십익(十翼)을 이루어 놓기 이전은 ‘주역(周易)’이 물론 복서미신(卜筮迷信)의 책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십익(十翼) 이후의 해설은 매우 철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의 복서(卜筮)도 사실은 단순한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占)이라 하는 것 역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현상과 상황을 우리들의 일상적 관점과는 다른 논리로 재해석하고 조명하는 인식체계입니다.
그것 역시 사물과 변화에 대한 판단형식의 일종이며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철학적 구조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농경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는 유한공간(有限空間)사상이며 사계(四季)가 분명한 곳에서 발전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반복적 경험의 축적과 시간관념의 발달 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겨울이 지속되는 극지(極地)나 반대로 일년 내내 여름인 상하(常夏)의 나라에서는 발달하기 어려운 문화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만이 사물과 사물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천착해 들어갈 수 있으며 변화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동안에 비로소 그 변화를 법칙적으로 읽으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역사상은 유목적 생활환경에서는 발전하기 어려운 사상형태입니다. 유목생활은 기본적으로 무한공간(無限空間)사상입니다. 일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따라서 어제의 경험이 오늘이나 내일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적 경험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본적 문화가 과거의 경험을 매우 중시하는 이를테면 ‘노인보수문화’임에 비하여 유목적 문화는 어제의 경험이나 노인들의 경험이 별로 의미가 없는 문화입니다.
오히려 청년전위(靑年前衛)문화입니다. 상(商)문화는 유목적 문화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주나라 문화는 상(商)문화와 여러 면에서 구별됩니다. 아마 상(商)과 주(周)의 차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역은 주(周)나라 문화와 사상의 토대이며 이후 중국문화, 동양적 사고의 기본적 틀이 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공자는 주역을 열심히 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편삼절(韋編三絶)이란 말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죽간(竹簡)으로 되어 있는 주역의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많이 읽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주역 대성괘를 예제로 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이 어떤지 그리고 괘사(卦辭)와 단전(彖傳)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지천태(地天泰)
주역에는 대성괘가 64개가 있습니다. 64개를 모두 읽을 수는 없지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개의 괘는 그 경(經)과 전(傳)을 온전하게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역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의 괘는 그 핵심적인 의미만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천태(地天泰)괘를 보기로 하지요. 지천태 괘를 우선 여러분들이 그려보시지요. 천(![]() )위에 지(
)위에 지(![]() )를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를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
이제 이 지천태 괘의 경(經)과 전(傳)을 모두 소개합니다. 먼저 괘사(卦辭)입니다. 이 괘사는 물론 경(經)입니다. 8괘, 64괘, 괘사(卦辭), 효사(爻辭) 이 4가지를 경(經)이라 한다고 하였지요. 기억하시지요?
卦辭 泰 小往大來 吉亨
괘사 : 태(泰)괘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 길하고 형통하다.
이 괘를 판단한 단전(彖傳)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전은 물론 경(經)이 아닙니다. 전(傳)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彖曰 泰 小往大來 吉亨 則是天地交 而萬物通也 上下交 而其志同也 內陽外陰 內健外順 內君子而外小人 君子道長 小人道消也
단(彖)에 이르기를 태(泰)괘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천지가 만나고 만물이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하(上下)가 만나고 그 뜻이 같다. 내괘(內卦)는 양(陽)이고 외괘(外卦)는 음(陰)이다. 안은 강건(剛健)하고 바깥은 유순(柔順)하다. 군자가 안에 있고 소인이 바깥에 있다. 군자의 도(道)는 장성(長成)하고 소인의 도(道)는 소멸(消滅)한다.
상전(象傳)은 다음과 같습니다.
象曰 天地交泰 后以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后(후) : 천상(天上)의 제(帝)에 대하여 지상의 통치자(제후를 포함)
財成(재성) : 재성(裁成). 재단하여 이룸.
輔相(보상) : 도우다. 左右(좌우) : 인도하다.
주(註)를 자세히 달았습니다. 각자가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상(象)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태평하다. 왕자는 이 괘(卦)를 보고(后以) 천지의 도(道)에 천지(사람)의 마땅(正義)함을 보태어 대성하게 하고 인민을 (태평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태괘(泰卦)는 주역 64괘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괘라 합니다.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이 서로 화합하여 서로 교통(交通)하는 괘입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모양은 물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의 형상과는 역전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태화(泰和)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위로 향하고 땅의 기운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만난다는 이치입니다. 서로 다가가는 마음입니다. 다음 예제인 천지비(天地否) 괘는 이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지천태 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의미입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라는 금언이 바로 이 태(泰)괘의 사상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가 개인의 경우에도 태화(泰和)의 근본입니다.
경복궁에 가본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교태전(交泰殿)이 있습니다. 중전(中殿)마마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흔히 중전이 교태(嬌態)를 부려 임금과 침소에 드는 곳이라고 오해합니다만 경복궁 교태전(交泰殿)은 바로 주역의 지천태(地天泰) 괘에서 이름을 딴 것입니다. 천지교태(天地交泰)입니다.
천지가 뒤바뀐 모양을 태화(泰和)의 의미로 풀이하는 까닭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周)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 듯이 쿠데타에 의하여 건국된 나라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은(殷)의 폭군 주(紂)왕의 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가 그것입니다. 주(周)나라 건국을 합리화하는 괘로 풀이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천태 괘를 천지개벽(天地開闢)의 괘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혁명의 괘로 풀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上下)가 뒤바뀐 것에서 그러한 풀이를 이끌어냅니다.
천지개벽과 혁명은 장기적으로 보면 태화의 근본임에 틀림없습니다. 혁명은 한 사회의 억압구조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억압당한 역량을 해방하고 재갈물린 목소리를 열어줍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잠재적인 역량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혁명은 흔히 혼란과 파괴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그래서 지천태라는 뒤집힌 형국 즉 혁명의 의미가 어떻게 태화의 근본일 수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은 납득하기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혁명을 치르지 않은 나라가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을 치르지 않은 사회는 두고두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이런 관점으로 지천태 괘를 읽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효사(爻辭)를 읽어봅시다. 효사를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위조직(前衛組織)의 건설과 전개과정을 상정하고 읽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국가의 일생 즉 국가를 창건하여 흥성과 쇠망에 이르는 일국의 흥망사로 읽어도 좋습니다.
初九 拔茅茹 以其彙 征吉
拔(발) 뽑다. 茅茹(모여) : 띠풀.
彙(휘) : 떨기. 征(정) : 가다.
띠풀을 뽑듯이 떨기로 가야 길하다는 뜻입니다. 띠풀은 잔디나 땅콩처럼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띠풀은 한 포기를 뽑으려 하면 연결되어 있는 줄기가 함께 뽑힙니다.
모든 시작은 ‘여럿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창건이든, 회사 설립이든, 또는 전위조직의 건설이든 많은 사람들의 중의(衆意)를 결집하여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象曰 拔茅征吉 志在外也
이것은 효(初九)를 설명하는 소상(小象)입니다. ‘발모정길’의 까닭은 즉 띠풀을 뽑듯이 가야 길하다는 의미는 그 뜻하는 바가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 뜻하는 바가 바깥에 있다는 것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대의(大義)와 정의(正義)를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의미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九二 包荒 用馮河 不遐遺 朋亡 得尙于中行
包荒(포황) : 거친 것을 포용하다. 즉 황예(荒穢)를 포용한다.
馮河(빙하) : 황하를 맨발로 건너다.
遐遺(하유) : 멀리하거나 버림. 朋亡 得尙于中行
제2효인 이 효는 시간적으로 아직도 초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세를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2효의 해석에 참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경탁 주석본(註譯本)의 풀이를 소개합니다.
“여러 오랑캐 족속을 포섭해서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간다. 먼데 남아있는 사람까지 버리지 않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으면 중용의 덕행을 숭상함으로써 그를 얻는다.”
제2효의 의미는 다음의 소상(小象)에서 풀이하고 있듯이 그 뜻을 널리 천명하고(光), 그 세(勢)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오랑캐에 국한하기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받아들임에 있어서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듯이 초기 단계에서 흔히 요구되는 과단성도 잃지 말아야 하며 남아 있는 사람 즉 주변에 있는 비주류도 멀리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붕망(朋亡) 즉 붕당(朋黨)이 없어야(亡) 한다. 항상 중용의 정도를 행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象曰 包慌 得尙于中行 以光大也
제2효를 설명하는 소상(小象)입니다. ‘포황 득상우중행’의 의미는 그것으로써 빛내고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을 널리 알리고 조직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九三 无平不陂 无往不復 艱貞无咎 勿恤其孚 于食有福
陂(피) : 기울다.
艱貞(간정) : 어렵지만 곧게 가짐.
평탄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는 평지는 없으며 지나가기만 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과거는 없다. 어렵지만 곧게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근심하지 마라 식복이 있으리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제3효는 소성괘(小成卦)인 하괘(下卦)의 상효(上爻)입니다. 한 단계가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평불피 무왕불복’은 어려움은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이다. 한번 겪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겪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그에 따른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럴수록 곧게 마음을 가지고 최초의 뜻, 즉 믿음(孚)을 회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복(福)은 대체로 식복(食福)이었나 봅니다.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象曰 无往不復 天地際也
되돌아 오지 않는 과거는 없다는 것은 천지의 제(際)이다. 라고 소상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애매한 풀이입니다.
제(際)의 의미를 천지의 만남이라고 주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천지의 법칙 즉 운동법칙이라는 의미로 풀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춘하추동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화복(禍福)도 대체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런 의미로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六四 翩翩 不富以其隣 不戒以孚
翩翩(편편) : 새들이 뿔뿔이 흩어짐.
戒(계) : 경계하다.
왕필(王弼) 주(註)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훨훨 날듯이 부유해지지 않아도 이웃과 (富를) 함께 하여 경계하지 않아도 믿는다.”
‘翩翩 不富以其隣’을 ‘翩翩不富 以其隣’으로 끊어서 읽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제4효가 상괘(上卦)의 첫효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5효와 6효의 효사에서 읽을 수 있듯이 흥망성쇄의 사이클이 하향(下向)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편편(翩翩)은 세력이 분산되고 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새들이 흩어지듯 그 세(勢)가 약화(弱化)되는 것은 그 부를 이웃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써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로 읽어서 그 세가 약화되는 이유를 짚어보는 내용으로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향곡선을 그려온 과정에서, 즉 세력이 장성되어온 과정에서 그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았고 최초의 공명정대했던 뜻, 즉 지재외(志在外)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象曰 翩翩不富 皆失實也 不戒以孚 中心願也
이 소상(小象)은 “편편불부는 실질을 모두 잃음이요 불계이부는 중심으로 원함이다”라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편편불부를 붙여서 읽고 있다는 사실과 또 불계이부를 긍적적인 의미로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불계이부는 구태어 경계하지 않아도 믿는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러나 편편불부를 왕필 주(註)에서처럼 “훨훨 날 듯이 부유해지지 않아도” 라고 읽는다면 그것이 계실실야(皆失實也) 즉 모두 잃는다는 뜻과는 상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六五 帝乙歸妹 以祉元吉
帝乙(제을) : 은나라 임금으로, 누이를 신분을 낮추어 신하인 주의 문왕(文王)에게 출가시켰음.
歸(귀) : 여자가 시집가는 것.
제을이 누이를 시집보냈다. 복되고 크게 길하리라.
제5효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괘 전체를 두량(斗量)하는 자리입니다. 양효의 자리에 음효가 있어서 비록 득위(得位)는 못하였지만 음효의 공능(功能)인 유순(柔順)하고 겸손(謙遜)함이 있어서 크게 길할 것이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象曰 以祉元吉 中以行願也
그게 길할 것이라 함은 중(中) 즉 제5효가 행원(行願) 즉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上六 城復于隍 勿用師 自邑告命 貞吝
隍(황) : 성 주변의 해자(垓字). 황참(隍塹).
用師(군대) : 군대를 움직이다. 告命(고명) : 왕명이 통한다.
貞吝(정인) : 곧더라도 궁색하다.
제6효인 상효(上爻)는 전 과정의 종결(終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城)이란 글자그대로 흙(土)을 쌓은(成) 것입니다.
평지의 흙을 파서 쌓으면 성(城)이 되고 흙을 파낸 자리는 황(隍)이 됩니다. 그 구덩이에 물을 채워서 해자(垓字)를 만들지요. 이제 그 쌓은 흙이 황(隍)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성(城)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를 움직이지 마라. 즉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자읍고명(自邑告命)은 자기의 마을에서만 명을 받든다. 즉 왕명이 널리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인(貞吝)은 바른 일도 비난받는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역사(歷史)가 그렇고 일생(一生)이 그렇고 모든 과정(過程)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象曰 城復于隍 其命亂也
성복우황 즉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명령이 어지럽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 지천태(地天泰)의 괘를 주로 전위조직과 관련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사의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그러한 의미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지천태 괘가 바로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는 혁명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띠풀을 뽑듯이 함께 간다는 것은 조직의 이념이 광범한 민주적 지반 위에 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실천은 철저히 대중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으며 조직의 내포(內包)를 어떻게 공고히 하고 외연(外延)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를 경계하지 않고 진실로써 결속하여야 하고 이해관계로써 결속하기보다는 초기의 이념적 목표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 등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와 보수적 경향에 대한 경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천지비(天地否)
천지비(天地否) 괘는 가장 좋지 않은 괘의 예로 듭니다. 지천태(地天泰) 괘와는 그 모양이 반대입니다. 지(![]() )위에 천(
)위에 천(![]() )을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을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형상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입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괘를 비(否)괘라 이름하고 그 뜻을 ‘막힌 것’으로 풀이합니다. 비색(否塞) 즉 소통되지 않고 막혀있는 상태로 풀이합니다. 천지폐색(天地閉塞)의 괘입니다.
지천태(地天泰) 괘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풀이합니다. 하늘의 기운은 올라가고 땅의 기운은 내려가기 때문에 천지가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저 혼자 높고 땅은 하늘과 아무 상관없이 저 혼자 아래로 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지가 불교(不交)하고 만물이 불통(不通)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비 괘는 그 요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효사(爻辭)를 읽지 않겠습니다. 괘사(卦辭)는 아래와 같습니다.
否 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비(否)는 인(人)이 아니다. 군자가 올바름을 펴기에는 이롭지 않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人)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人’ 자의 모양처럼 서로 도우는 것이 그 속성인데 천(天)과 지(地)가 서로 불교(不交)하기 때문에 비인(匪人) 즉 사람이 아니라고 풀이한 것이지요.
이 괘를 해석하는 단(彖) 역시 지천태 괘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彖曰 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則是天地不交 而萬物不通也
上下不交 而天下无邦也 內陰而外陽 內柔而外剛 內小人而外君子
小人道長 君子道消也
否(비) : 否塞. 막힘. 匪人(비인) : 非人. 人은 관계로 읽는다.
비(否)는 인(人)이 아니다. 즉 사람의 본성이 거부된 상태이다. 군자가 올바름을 펴기에는 이롭지 못하다.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을 것이다. 천과 지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물은 서로 통하지 못한다. 상하의 마음이 서로 화합되지 못한다. 천하에 나라가 없는 형국이다. 무방(無邦) 즉 나라가 없다는 뜻은 나라를 공동체(共同體)로 이해할 경우 약육강식의 패권적(覇權的) 질서가 판을 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또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뜻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불교(不交), 불통(不通)이야말로 정의실현(正義實現)이나 공동체 건설에 결정적인 장애라고 보는 것이지요. 내괘(內卦)가 음(陰)이고 외괘(外卦)가 양(陽)이다. 이것은 내심은 유약(柔弱)하면서 겉으로는 강강(剛强)함을 가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핵심에는 소인들이 차지하고 군자는 변두리로 밀려난다. 그리하여 소인의 도(道)는 장성하고 군자의 도(道)는 소멸한다.
천지비(天地否) 괘의 대상(大象)은 다음과 같습니다.
象曰 天地不交 否 君子以 儉德辟難 不可榮以祿
儉德(검덕) : 유덕함을 숨김.
辟難(피난) : 난을 피함. 祿(녹) : 벼슬.
천지는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막혀있다. 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덕(有德)함을 숨김으로써 난을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록(官祿)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벼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천지비 괘는 한마디로 폐색(閉塞)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식민지 상황은 물론이고 해방 후의 현대사를 통하여 줄곧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였지요. 이러한 폐색의 상황에서는 지혜를 숨기고 어리석음(愚)을 가장하여 권이회지(卷而懷之)하며, 나아가기(進)보다는 물러나기(退)를 택하여 강호(江湖)에 묻히는 것이 처세(處世)의 일반적 방식이지요.
지천태 괘와 천지비 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같이 교(交)와 통(通)이라는 코드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교(交)와 통(通)이 곧 ‘관계’입니다. 이것이 주역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관계론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천태 괘가 가장 좋은 괘이고 반대로 천지비 괘는 가장 좋지 않은 괘인 것은 위에서 본 대로입니다.
그러나 태(泰)괘와 비(否)괘의 내용을 검토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즉 태(泰)괘의 전반부는 매우 순조롭고 상승적인 반면에 후반부는 어렵고(艱難) 쇠락(衰落)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비(否)괘는 전반부가 간난과 쇠락의 국면임에 비하여 후반부가 오히려 순조롭고 상승적인 국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태(泰)괘의 후반과 비(否)괘의 후반이 같은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泰)괘는 선길후흉(先吉後凶)임에 비하여 비(否)괘는 선흉후길(先凶後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양적 사고에 있어서는 선흉후길이 선호됩니다. 장자(莊子)의 조삼모사(朝三募四)도 그러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정서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괘가 흉하고 비괘가 길하다는 길흉도치의 역설적 구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역은 이처럼 어떤 괘를 배타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고 또 미리 주어진 고정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존재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성괘(大成掛)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괘 역시 다른 대성괘와의 관계에 의하여 재해석되는 중첩적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산지박(山地剝)
산지박(山地剝) 괘의 모양을 그려보지요. 산은 ![]() (艮)이고 地는 물론
(艮)이고 地는 물론 ![]() (坤)입니다.
(坤)입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
그리고 박(剝)은 빼앗긴다. 박탈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박괘는 괘사(卦辭)와 상구(上九)의 효사(爻辭)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剝 不利有攸往
박괘는 이로울 것이 없다. 잃게 된다.
박(剝)괘는 글자 그대로 빼앗기고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괘는 주역 64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괘입니다.
초효부터 5효에 이르기까지 모두 음효입니다. 음적양박(陰積陽剝)의 형상입니다. 양(陽)을 선(善), 음(陰)을 악(惡)으로 보면 악이 득세하고 있는 말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악으로 쌓여 있고 단 한 개의 양효(陽爻)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개의 양효마저 언제 음효로 전락될지 알 수 없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입니다. 붕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괘를 다섯 마리의 고기가 꿰미에 매달려 있는 고단(孤單)한 형국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산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형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형상이지만 천지비(天地否)괘와 마찬가지로 막힌 괘로 읽고 있습니다.
교재에 효사를 전부 싣지는 않았습니다만 초육(初六)에서 육오(六五)까지의 효사(爻辭)는 상(床)이 그 다리에서부터 삭아서 무너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괘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절망(絶望)의 괘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곧 희망(希望)의 기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구(上九)의 효사(爻辭)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上九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
象曰 君子得无 民所載也 小人剝廬 終不可用也
씨 과실은 먹지 않는다. 군자는 가마를 얻고 소인은 거처를 앗긴다.
군자는 얻는 것이 없으나 백성의 추대를 받게 되고 소인은 거처를 앗기고 종내 쓰일 데가 없어진다.
상구(上九)의 양효(陽爻)는 관어(貫魚)의 꿰미 또는 ‘씨 과실’ 또는 최후의 이상(理想)으로 읽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은 내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붓글씨로 써서 아마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왕필주(王弼註)에서는 이 석과불식을 '씨 과실은 먹히지 않는다'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獨全不落 故果至于碩 而不見食’ 즉 홀로 떨어지지 않고, 씨 과실로 영글고, 먹히지 않는다고 풀이합니다.
‘먹지 않는다’보다는 ‘먹히지 않는다(不見食)’,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괘의 상황은 흔히 늦가을에 가지 끝에 남아 있는 감(![]() )을 연상합니다. 까마귀밥으로 남겨두는 크고 잘 생긴 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을 연상합니다. 까마귀밥으로 남겨두는 크고 잘 생긴 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단 감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은 먹지 않고 씨받이로 남기는 것이지요.
산지박(山地剝) 다음 괘가 지뢰복(地雷復)괘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
땅 밑에 우레가 묻혀있는 형상입니다. 잠재력(雷)이 땅 밑에 묻혀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復)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광복절(光復節)의 복(復)입니다.
‘一陽復來 一陽生 朋來无咎 反復其道 春來’가 괘사입니다.
상구(上九)가 최후의 양심(良心), 최후의 이상(理想)이고 그것이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은 있는 셈이지요. 박괘는 64괘 중 가장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는 괘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변증법을 발견합니다.
이 박괘는 흔히 혼돈세상(混沌世上)에서 사상적 순결성(純潔性)과 지조(志操)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현명한 판단과 의지가 요구된다는 윤리적 차원에서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빈사양처(家貧思良妻), 세란식충신(世亂識忠臣),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등이 그러한 풀이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을 분별할 수 있으며 세찬 바람이 불면 어떤 풀이 곧은 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비단 이 박괘의 상전(象傳)과 단전(彖傳)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희망을 만들어 가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고난의 언어이며, 희망은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처하여 가능성을 경작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나무 끝에 달려 있는 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도 그렸습니다.
이 마지막 남아 있는 감이 희망을 상징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씨 과실’이 되어 다음 단계의 가능성으로 땅 밑에 묻혀서 싹이 트고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무엇보다 모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나목(裸木)으로 서는 일입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일이지요. 그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가지를 직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화려한 의상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구조(構造)’를 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IMF사태’가 왔을 때 내심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식량자급율 27%, 그나마 그 27%는 기름으로 짓는 농사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100% 수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IMF사태는 우리의 취약한 구조를 직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그 구조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소위 문민정부의 출범 때에도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만달러 소득이라는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거품과 허위의식을 청산하고 4, 5천달러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단이 필요하였지요.
그러나 그 때나 IMF때나 미봉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주체적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종속성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구조의 중하위권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한 인식능력과 의지력(意志力)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희망은 현실을 직시하는 일에서부터 키워내는 것이라는 것을 박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현재의 실상(實狀)을 직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4)화수미제(火水未濟)-1
화수미제 괘는 64괘의 제일 마지막 괘입니다. 마지막 괘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화수미제 괘를 그려보지요. 물(![]() )위에 불(
)위에 불(![]() )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
이 화수미제 괘의 경우도 괘사와 단전 상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괘사를 읽어보지요.
未濟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未濟(미제) : 끝나지 않음. 小狐(소호) : 어린 여우.
迄(흘) : 거의 濡(유) : 물에 적시다.
미제 괘는 형통하다. 어린 여우가 강을 거의 다 건넜을 즈음 그 꼬리를 적신다.
이로울 바가 없다.
강을 거의 다 건넜다는 것은 일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적신다는 것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만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사에 머리를 적신다(濡其首- 上九)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 꼬리를 적시는 것에 비하여 더 큰 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彖曰 未濟亨 柔得中也 小狐汔濟 未出中也 濡其尾 无攸利 不續終也 雖不當位 剛柔應也
미제 괘가 형통하다고 하는 까닭은 음효가 중(中 즉 제5효)에 있기 때문이다. 어린 여우가 강을 거의 다 건넜다 함은 아직 강 가운데로부터 나오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꼬리를 적시고 이로울 바가 없다고 한 까닭은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효가 득위하지 못하였으나 음양상응을 이루고 있다.
미제 괘에서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5효가 음효라는 사실이 이 괘가 형통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5효는 양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괘의 전체적 성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中)이라 합니다. 대체로 군주(君主)의 자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중(中)의 자리에 음효가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전의 해석에 근거하여 동양사상에 있어서는 지(地)와 음(陰의) 가치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제 괘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중(中)에 음효(陰爻)가 오는 경우를 길형(吉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음(陽陰)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음양(陰陽)이라 하여 음(陰)을 앞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사상은 기본적으로 땅의 사상이며 모성(母性)의 문화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꼬리를 적시고’, ‘이로울 바가 없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끝마치지 못한다’는 일련의 사실입니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실수와 실수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한 실수가 있기에 그 실수를 거울삼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끝나는 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든 강물이든 생명이든 밤낮이든 무엇 하나 끝나는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마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완성이란 것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64개의 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미완성의 괘를 배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요.
그리고 비록 (모든 효가) 마땅한 위치를 얻지 못하였으나 강유(剛柔) 즉 음양이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位)와 응(應)을 설명하면서 비록 실위(失位)이더라도 응(應)이면 무구(無咎) 즉 허물이 없다고 했지요. 위가 개체 단위의 관계론이라면 응은 개체간의 관계론으로서 보다 상위의 관계론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실패한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이지요. 응(應) 즉 인간관계를 디딤돌로 하여 재기하는 것이지요. 작은 실수가 있고, 끝남이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상태 등등을 우리는 이 단전(彖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상전(象傳)은 다음과 같습니다.
象曰 火在水上 未濟 君子以 愼辨物居方
불이 물 위에 있는 형상이다. 다 타지 못한다. 군자는 이 괘를 보고 사물을 신중하게 분별하고 그 거처할 곳을 정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본 것이 미제 괘(未濟卦)의 괘사(卦辭)와 단전(彖傳), 상전(象傳)입니다.
나는 이 괘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미제 괘가 왜 주역 64괘의 마지막 괘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 주역을 읽었을 때에는 미제 괘가 꼭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요. 마지막 단계에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끝이라고 방심하다가 아니면 얼른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다가 그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떤 일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속도를 늦추고 평소보다 긴장도를 높여서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미완성 괘가 주역의 마지막 괘라는 사실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최후의 괘가 완성 괘(完成卦)가 아니라 미완성 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변화와 모든 운동의 완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역사와 삶의 궁극적 완성이란 무엇이며 그러한 완성태(完成態)가 과연 존재하는가를 반성하는 괘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산 줄기를 타고 내린 물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되어 만나서 다시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漢江)은 무엇을 완성하기 위하여 서해로 흘러드는지...그리고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무엇을 완성하려고 바람서리 견디며 서 있는지...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미제 괘는 모든 효가 실위(失位)하고 있지만 응(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상태 즉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가능성은 어느 개인의 결심이나 그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 실패로 끝나는 미완성과 실패가 없는 완성 중에서 어느 것이 사물과 변화의 보편적 상황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있는 미완성은 반성(反省)이며, 새로운 출발이며, 가능성이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이 사물과 변화의 보편적 상황이라면 남는 것은 결국 과정(過程)이며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완성이나 달성(達成)이란 개념은 관념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완성(完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목표(目標)’의 개념은 없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남는 것은 과정입니다. 목표와 수단이라는 관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목표가 선량(善良)하면 수단이 불량(不良)하여도 상관없다는 논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면 된다’라든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과 강제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만연한 ‘속도(速度)’의 개념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속도와 효율성 이것은 자연의 논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본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로(道路)의 속성을 반성하고 ‘길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고속(高速)일수록 좋습니다. 오로지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도로의 개념입니다. 짧을수록 좋고, 궁극적으로는 제로(0)가 되면 자기목적성에 최적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길’은 도로와 다릅니다. 길은 길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코스모스를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나란히 걷는 동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 터이기도 하고, 자기발견의 계기이기도 하고, 자기를 남기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역의 사상을 이러한 마음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주역을 새롭게 읽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내가 붓글씨로 즐겨 쓰는 구절을 소개하지요.
“목표의 올바름을 선(善)이라 하고 목표에 이르는 과정(過程)의 올바름을 미(美)라 합니다. 목표와 과정이 함께 올바른 때를 일컬어 진선진미(盡善盡美)라 합니다.”
진선진미란 구절은 논어에 나옵니다만 이곳에 쓰여진 의미와는 다릅니다. 나는 목표와 과정은 서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盡善)하지 않으면 진미(盡美)할 수 없고 진미하지 않고 진선할 수 없는 법입니다. 목적과 수단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높은 단계의 수단이며 수단은 낮은 단계의 목적입니다.
화수미제 괘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주역 강의가 아니더라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5) 주역의 관계론 재론
주역 사상을 계사전(繫辭傳)에 단 세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가 그것입니다.
역이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하다는 것은 사물의 변화가 궁극에 이르면 즉 양적 변화와 양적 축적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적 변화는 새로운 지평(持平)을 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통(通)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상황은 답보(踏步)하지 않고 부단히 진보(進步)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久)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사전에서 요약하고 있는 주역 사상은 한마디로 ‘변화(變化)’입니다. 주역은 사물의 변화와 발전을 해명하려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를 읽음으로써 고난을 피하고 안락함을 얻으려는 현실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취락(避苦取樂)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주역은 사물(事物)과 사건(事件)과 사태(事態)에 대한 일종의 範疇(kategorie)적 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칸트의 판단형식(判斷形式)의 성격을 주역은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주역의 64괘를 철학적 범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적 성격은 동시에 객관적 세계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종류를 표현하는 진술형식(陳述形式)이나, 최상위의 유개념(類槪念)과 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역 서론 부분에서 이미 이야기했다고 기억합니다. 요컨대 주역은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인식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역에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철학적 구도 이외에 매우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사상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아닌 절제(節制)사상으로서의 주역입니다.
일례로 건위천(乾爲天)괘의 상구(上九)의 효사(爻辭)입니다. 항룡유회(抗龍有悔) 즉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용은 후회한다는 경계입니다. 초로 만들어진 이카루스의 날개가 태양열에 녹아서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하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위에서 주역은 변화의 철학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변화를 사전(事前)에 읽어냄으로써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서 변화 그 자체를 조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제란 바로 이 변화의 조직,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절제와 겸손이란 자기가 구성,조직한 관계망(關係網)의 상대성에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법이 로마 이외에는 통하지 않는 것을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논의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직한 ‘관계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택된 여러 부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과학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구성한 세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지인을 망라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중심의 주관적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역의 범주는 그것이 판단형식이든 아니면 객관적 존재에 대한 진술형식이든 그 범주는 제한성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겸손이란 바로 이러한 제한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로써 주역을 마칩니다. 대성괘 몇 개를 그것도 일부만 읽어보는 것으로 주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자의 위편삼절(韋編三絶)이란 주역을 두고 일컬은 말입니다.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씩이나 끊어질 정도로 많이 읽었다는 것이 바로 이 주역입니다.
그만큼 공자가 심혈을 기울여 읽은 책이 바로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책은 죽간(竹簡)이기 때문에 가죽끈이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이를 묶었건, 대나무 쪽을 묶었건 가죽끈이 3번씩이나 끊어진다는 것은 여간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역 강의를 마치면서 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나로서는 주역 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아마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산대사(西山大師)가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 있을 때 자신의 영정(影幀)에 쓴 시(詩)입니다.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저것이로구나
'고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채근담(번역) (0) | 2009.01.28 |
|---|---|
| [스크랩] 채근담 전집 해설 (0) | 2009.01.28 |
| [스크랩] 제4강 초사(楚辭) (0) | 2009.01.28 |
| [스크랩] 제3강 서경(書經) (0) | 2009.01.28 |
| [스크랩] 제2강 시경(詩經) (0) | 2009.01.28 |